
“농업과 환경은 오랫동안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인류의 먹거리를 위한 농업 생산이 환경에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온 것이죠. 이제는 농업 생산 체계를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농업에 투입되는 농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전략과 미래 비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철의 국립경국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화분매개 서식처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2014년부터 신젠타코리아와 안동시 길안면 사과재배 지역에서 화분매개곤충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길안면 일대에 유채(3월~5월), 청보리 및 메밀(3월~8월), 청보리 및 참나리(3월~8월), 코스모스(8월~10월) 등의 초종을 재식해 6헥타르(ha) 규모까지 화분매개 서식처를 조성하면서 생물 다양성과 지역 농업인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물 다양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인다는 원래의 의미도 컸지만, 자연의 보존과 농업의 생산성이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결과는 프로젝트 관계자 모두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서식처와 가까운 과수원에서 화분매개곤충 개체 수가 더 높게 나타나며 꿀벌 화분매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 확인됐죠. 그뿐 아니라 화분매개 서식처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서식처 인근 과수원의 초기 결실률이 올라가고 과실의 품질이 향상되는 등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관행 방제력과 신젠타 방제력 비교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사과 방제력’ 연구로 ‘화분매개 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Integrated pollinator-pest management, IPPM)’의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는 ‘신젠타 추천 방제력과 기존 관행 방제력 처리가 미치는 사과 병해충과 유용곤충의 발생 밀도와 사과 품질 영향 연구’이다. 신젠타코리아에서 제시한 방제 프로그램과 기존 관행 방제 프로그램을 농가가 같은 조건에서 적용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신젠타 방제 프로그램은 환경 위해성이 적은 제품을 신젠타코리아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했어요. 병해충의 억제뿐 아니라 사과 수정과 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화분매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심해진 기상 변동성을 반영한 방제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병해충 관리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과 민감성은 높아진 반면, 기존 방제력은 달라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해충이나 돌발해충 등에 대비하려면 기존 방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야할 시점이었다.
정 교수는 신젠타 약제를 대상으로 꿀벌 위해성 평가를 한 바 있다. 사과꽃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꿀벌 위해성이 있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조사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꿀벌 위해성을 고려하며 약제를 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번 사과 방제력 연구의 원동력이 됐다.
안동시 길안면-국립경국대학교-신젠타코리아가 체결한 MOU도 이번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길안면은 화분매개 서식처 구축 및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젠타는 화분매개자 교호성 연구를 위한 자재와 기술 지원을 전담했다. 국립경국대 연구팀은 신젠타 중심 방제력과 기존 관행 방제력의 병해충 발생상을 비교했다. 나아가 두 방제력의 화분매개자, 천적의 다양성 비교와 사과 품질 비교까지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사과 방제력 연구에서는 지난해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까?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해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사과굴나방, 사과애모무늬나방 포획수를 조사한 결과 기존 방제력과 신젠타 방제력 간에 뚜렷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린재류 집합페르몬 트랩 결과에서는 6월 상순~9월 상순까지 기존 관행 방제처리 과수원에서 더 높은 밀도를 형성했다. 진딧물류 밀도 조사 결과에서도 6월 최성기에 기존 방제력에서 밀도가 좀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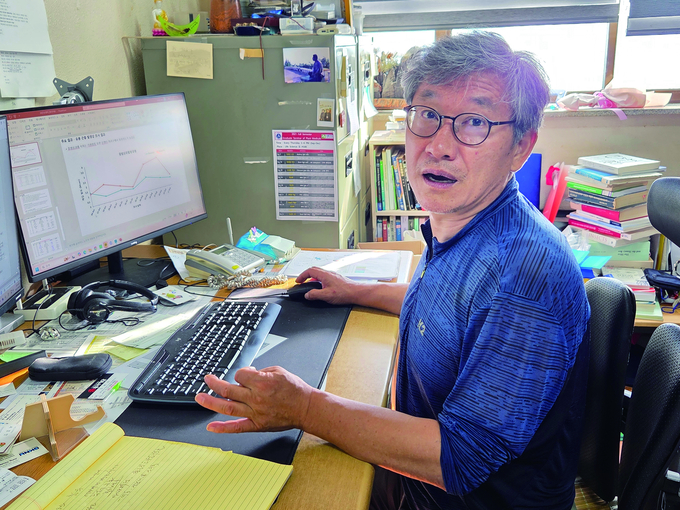
이를 통해 신젠타 약제들이 흡즙성 해충에서 효과가 높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다만, 점무늬썩음병과 갈색무늬병 발병률은 두 방제력 처리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수원 간의 발생률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생육기 방제체계 적용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가 요구되었다.
관심을 끄는 유용곤충 발생상 조사에서는 기생파리와 꽃등에류는 발생 밀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진딧물의 주요 천적인 풀잠자리류와 무당벌레류는 신젠타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좀벌상과에 속하는 기생벌류도 신젠타 처리구에서 발생 밀도가 높았다. 방제력 프로그램이 사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는 처리구 간 사과 품질의 분석 결과 무게, 과고, 과경, 둘레, 종자 개수, 당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관심있게 지켜본 유용곤충(천적)에서 풀잠자리, 무당벌레, 좀벌 등이 신제타 방제력에서 좀더 많이 나타났다”며 “이들의 해충 억제 능력에도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천적들의 역할을 배경방제 효과라고 합니다. 배경이 자연적으로 방제를 해주는 효과들은 20~40%만 꾸준히 해주면 해충의 밀도가 절반 정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유용곤충들에서 신젠타 방제력 선택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과 방제력 연구는 사과 농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 연구가 가능했다. 초생관리 등으로 환경을 관리하면서 꿀벌과 유용곤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선뜻 연구에 참여해 주었다.
신젠타 추천 사과 방제력과 기존 관행 방제력 연구는 올해도 이어졌고 작년과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 교수는 “화분매개 서식처 관리의 기반 위에서 꿀벌 위해성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기상변동을 대비해 병해충을 억제하고 유용곤충의 천적 기능을 활용하면서 사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제력 연구의 성과가 기대된다.
